오늘

고등학교때 그리 자주 등장하던 언어유희 부분... 다시봐도 재미나네요..
-----------------------------------------------------------------------
「고본 춘향전」에서 리 도령이 암행 어사로 되어 남원을 향해 내려가다가 임실(任實)을 지나 농민들과 담화하는 것을 서술한 데서 더욱 소박하면서도 흥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다.
“저 농군 여봅시 검은 소로 밭을 가니 컴컴하지 아니하니.”
농부 대답하되
“그러기에 밝으라고 볕 달았지요”
“달았으면 응당 더우려니”
“덤기에 성에’장 붙였지요”
“성에’장 붙였으니 응당 차지”
“차기에 소에게 양지머리 있지요”
이렇듯이 수작할 제 한 농부 내달으며
“우스운 자식 다 보겠다. 얻어 먹는 비렁뱅이 녀석이 반말지거리가 웬말인가. 저런 녀석ㅇ느 근중을 알게 혀를 순배째 뺄가보다”
그중에 늙은 농부 내달으며
“아서라, 이 애 그 말 말아. 그 분을 솜솜 뜯어 보니 주제는 허술하나 손’길을 보아하니 량반일시 적실하고 세폭자락이 바이 맹물은 아니로서. 저런 것이 어사같아여 무서우니라”
한 농군 하는 말이
“령감 너무 아는 체 마오. 손’길이 희면 다 량반이게요. 나는 이 놈을 뜯어 보니 룸 속에서 송곳질만 하던 갖바치 아들이 분명하오.”
이 짧은 대화 가운데는 농민들의 순박한 말투가 있다. 또한 그들의 지혜를 나타내는 말’재주가 있으며 량반을 조롱하는 목소리가 울리고 있다. 그들의 의식과 감정을 그들의 체험으로, 곧 리조 말기 조선 인민의 민족적 세태 풍습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pp.54-55.
-----------------------------------------
賞春曲 상춘곡
- 정극인 -
홍진에 묻힌 분네 이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가 못 미칠가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한 이 하건마는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모를 것가
수간 모옥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었세라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리 앵화는 석양리에 피어 있고
녹양 방초는 새우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 일체어니 흥인들 다를소냐
시비에 걸어 보고 정자에 앉아 보니
소요 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 진정을 알이 없이 혼자로다
이바 이웃들아 산천구경 가자스라
답청일랑 오늘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
아침에 채산하고 나조에 조수하세
갓괴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바퉈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화풍이 건듯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에 진다
준중이 비었거든 날더러 아뢰어라
소동 아해더러 주가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좋은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화로다
무릉이 가깝도다
저 뫼이 그 것인가
송간 세로에 두견화를 부치들고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 만락이 곳곳에 벌려 있네
연하 일휘는 금수를 재폈는 듯
엊그제 검은 들이 봄 빛도 유여할사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청풍 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고
단표 누항에 흩은 혜음 아니하네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조선 태종에서 성종까지 생존했던 정극인(丁克仁)의 작품. 최초의 가사라는 설이 강하며 벼슬에서 물러난 양반 문인이 봄이 되어 피어나고 자라나는 자연의 모습을 관찰하며 자연의 기쁨에 자신의 감정을 실어 봄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양반가사(兩班歌辭)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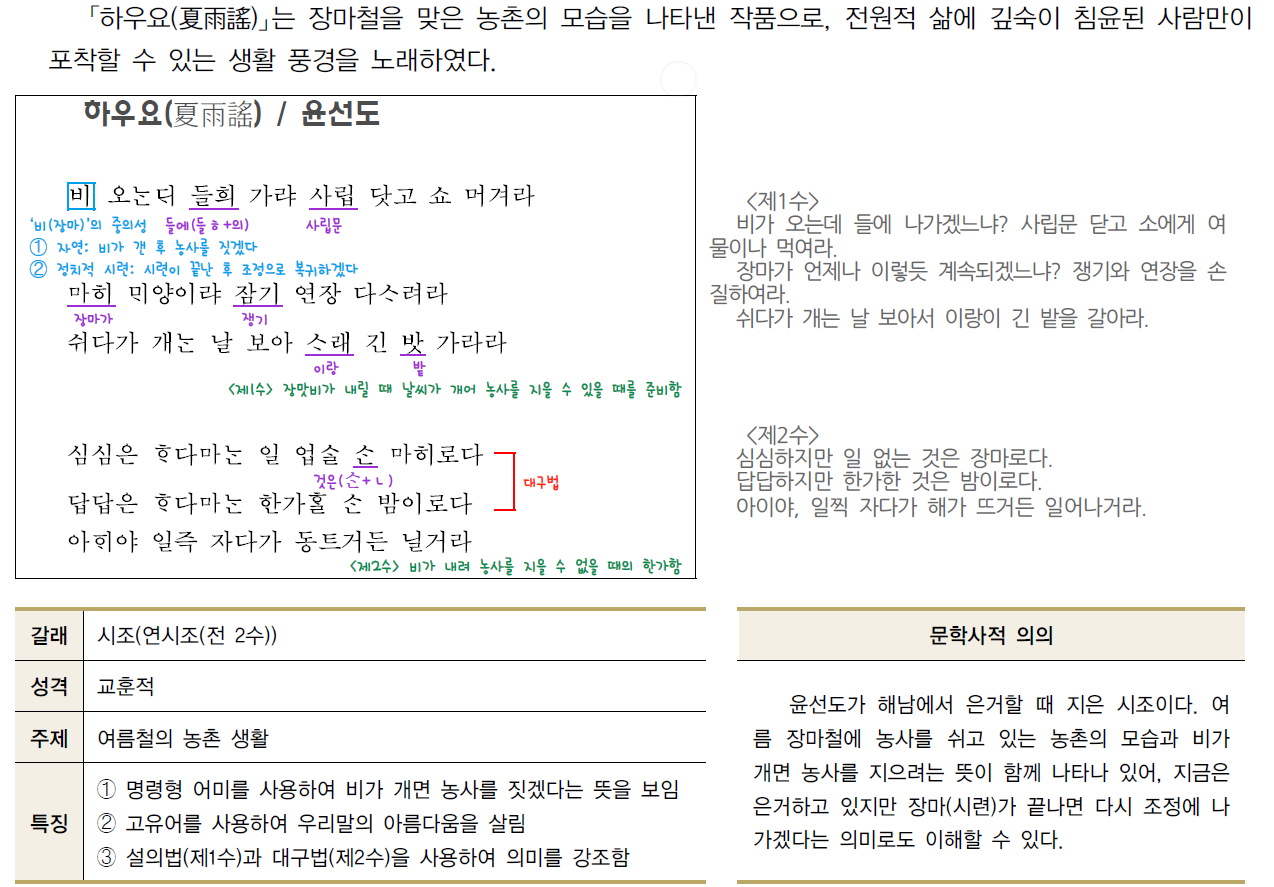
출처 EBS 이욱조

